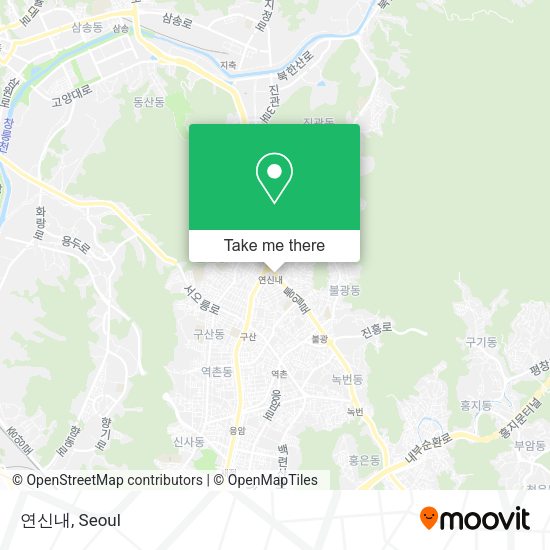
<에피> 16호 ‘장애와 테크놀로지’를 읽고 한 생각
-매드 프라이드의 ‘프라이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20세기 정체성 운동의 성과 중 하나는 ‘퀴어’라는 말을 성소수자 스스로가 재전유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 상징적 차원에서든 실질적 차원에서든.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을 폄하하는 언어(“[Slang] homosexual: in general usage, still chiefly a slang term of contempt or derision”)를 다른 맥락 속에 놓이게 함으로써 그 말이 가지고 있던 폄하와 낙인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를 마련했다(“but lately used as by some academics and homosexual activists as a descriptive term without negative connotations.”). 이러한 운동 방식은 퀴어 운동을 넘어 여타의 정체성 운동에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체성 운동에서의 ‘정체성'(정체성 운동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정체성 개념은 ‘정체성’으로 표기함)이 사회적 부정을 통해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정체성 운동에서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정체성’은 이 단어가 지칭하는 개념 일반이 아니다. 디디에 에리봉이 언급한 정체성 형성 과정은 ‘정체성’의 특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디디에 에리봉은 수치심이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수치심은 주체되기의 핵심적 기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때 수치심은 ‘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 그러니까 ‘누군가(또는 ‘나’)는 무언가이다’라고 호명되고 발화하기 이전부터 존재한다. 일상적 실천과 학습은 무엇이 수치스러운지를 정하는 사회적 프레임을 체화하게 하고, 자신이 그 ‘무엇’이라고 호명되면 그 사람은 개인적 차원의 수치심을 갖는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 수치심은 주체되기의 기반, 즉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런 관점을 따른다면 ‘정체성’은 수치심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 수치심이 왜 발생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정체성’의 기원은 사회적 부정 – 낙인과 편견, 비하 –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남자다’, ‘나는 장애인이다’라는 자기 기술 그 자체가 ‘정체성’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자기 기술이 삶 전반에서 체화된 사회적 부정, 그로 인한 수치심과 연결될 때 정치적 동력을 가진 ‘정체성’이 등장한다.
그렇기에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적 부정을 전복시키는 것은 당연히 정체성 운동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정체성 운동의 이와 같은 필연적 목적 속에서, ‘퀴어’의 재전유는 그 전복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체성’의 기원이 사회적 부정이라면, 그 사회적 부정을 전복시키는 것은 자칫 ‘정체성’의 전복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퀴어 운동은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부정은 전복하는 방식 – 자긍심으로서의 퀴어 – 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여타 정체성 운동에 적용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퀴어 운동의 특수성 내지는 퀴어 운동이 지닌 사회운동적인 강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적 지향은 –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비헤테로 성적 지향이 질환이라고 여겨지기는 했지만 – 분명 치료의 영역에 들지 않는다. 성소수자 당사자와 많은 엘라이들은 공통적으로 성적 지향이 병리적 증상이 아니라는 단단한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성적 지향을 바꿀 필요성 역시 없다는 공통의 입장을 전제한다. 성적 지향은 일종의 ‘단단한’ 정체성이다. 성적 지향은 노력에 의해 바꿀 수 없으며, 그러할 필요도 없(다는 합의가 매우 강하)기에 퀴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정체성’은 긍정하면서도 사회적 부정은 부정할 수 있었다. 즉 퀴어 운동에서는 ‘나 그대로에 대한 프라이드’라는 개념이 가능했다. 어떤 방식으로도 정체성을 바꿀 수 없으며, 바꾸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정체성 운동 중에서도 운동의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영역은 어떠할까?
정신장애의 영역에서 ‘프라이드’의 개념은 조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2002년부터 ‘매드 프라이드’라는 이름의 당사자 축제(또는 운동)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져 왔고, 한국에서도 2019년을 시작으로 동일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퀴어’의 재전유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질환 당사자들은 ‘광기(madness)’ 개념을 재전유하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체성’을 긍정하면서도 사회적 부정은 부정하는 퀴어 운동의 계보를 잇는다. 그러나 이 운동의 주체들 또는 잠재적 주체들이 퀴어 운동의 주체들만큼 단단한 합의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정신질환이 성적 지향과 마찬가지로 ‘바꿀 수 없으며,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 퀴어 운동과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퀴어 운동이 상정하는 ‘본래의 나’는 ‘바꿀 수 없는, 바꿀 필요가 없는 성적 지향을 가진 나’이다. 하지만 매드 프라이드가 퀴어 운동을 좇아 ‘본래의 나’를 ‘바꿀 수 없는, 바꿀 필요가 없는 정신 상태를 가진 나’로 정의할 수 있을까? 그간의 기분 장애 경험을 되살려봤을 때 약물을 통한 화학적 보조, 즉 일정 정도의 정신 상태 변화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화학적 보조는 때로 존재의 문제와 관련이 되며, 이는 정체성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다. 매드 프라이드의 사회적 정상성 부정이 ‘치료를 받지 말자’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동의할 수 있는 당사자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점에서 매드 프라이드가 긍정하는 ‘본래의 나’는 퀴어 운동의 그것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나 그대로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퀴어 운동의 모토가 매드 프라이드에서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 그대로’의 정의를 바꿈으로써 찾아낼 수 있다. 유기훈은 기존의 사이보그 개념을 빌려와서 ‘화학적 사이보그’로서의 나를 제안한다. 최근의 장애학은 휠체어 등 보조장비 사용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부정하고, 보조장비 사용을 기계와 몸의 결합을 통한 ‘사이보그로서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 실천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 해러웨이의 말마따나 기계와 유기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이보그로서의 몸은 나의 확장적 신체가 된다. 유기훈은 이러한 논의를 빌려 약물과 같은 화학적 보조를 받는 정신질환자들의 정신을 일종의 확장적 정신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매드 프라이드가 상정하는 ‘본래의 나’는 약물화된 나도, 약물화되지 않은 나도 포괄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매드 프라이드의 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매드 프라이드가 상정하는(상정할) 나 본연의 정신 상태란 어떠한 변화도 이뤄지지 않은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아니어야 한다). 비-사이보그로서의 정신도, 사이보그로서의 정신도 긍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신장애 영역에서의 ‘프라이드’는 오롯이 변치 않는 나에 대한 자긍심이 아니다. ‘매드 프라이드’는 때론 변화에 대한 자긍심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은 약물 치료에 대한 윤리적 비판 – “약물 치료를 통한 정신 상태의 변화는 ‘본래의 나’를 해치는 일이다” – 에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다. 또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에 더 큰 동원력과 생산적인 논의를 가져올 것이다. ‘본래의 나’를 규범화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누가 당사자인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스스로를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에 위치한다고 여겨 온 많은 경계인들 – 예컨대 약물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사라지는 질환자들 – 도 당사자 운동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합의를 통해 다른 논의를 위한 여력이 마련된다면, 정신질환을 둘러싼 여타의 사회적 의제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도 용이해질 수 있다. 특히 수십년 간 문제가 된 의료적 관점을 해소할 가능성이 생긴다. 확장적 정신 역시도 본래의 나라면, 나를 구성하는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다. 즉, 약물에 관한 정보를 얻고, 약물을 선택하는 과정이 모두 나를 구성하는 과정이 되며 환자-의사 간의 기존의 권위적 관계가 해소될 가능성이 열린다(높아지는 요구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