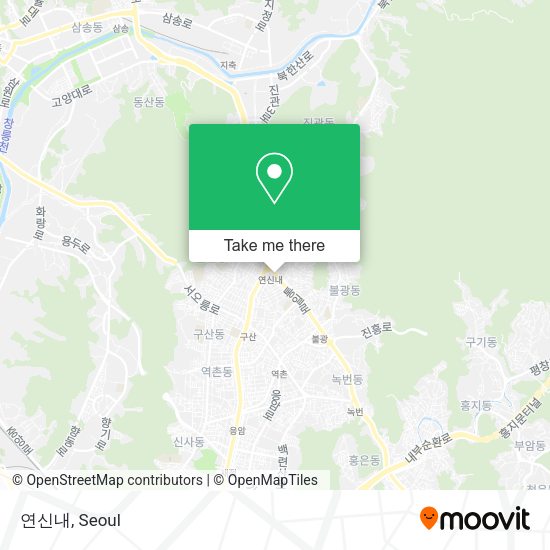
0. 버지니아 울프 <항해>를 빌려서 다시 보다가, 책은 너무 길고 좋아하는 부분은 너무 뒤에 있어서 그냥 앞부분을 포기했다. 책을 부분부분 읽는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
1. 레이첼의 열감과 두통을 묘사하는 부분이 좋다. 사실 이 책의 묘사 자체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울프의 관점과 관련해 내 마음대로 상상을 펼치면서 좋아졌다. 이 책의 묘사가 다른 문학들의 질병 묘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 특별했던 건 버지니아 울프가 <On Being Ill>에서 ‘신체에 대해 말하는 건 어렵고, 그래서 영문학에서 질병이 주된 주제가 되지 못했다’는 논지를 펼쳐서이다 – “English, which can express the thoughts of Hamlet and the tragedy of Lear, has no words for the shiver and the headache.” 질병이 영감의 원천이 된다는 식의 암시는 별로였지만(이 부분에 관해서는 질병과 은유에 관한 손택의 입장이 훨씬 와닿는다), 병리와 언어 간의 관계 때문에 아픈 이가 고립된다는 관점은 공감이 갔다.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의 문학적 표현은, 그 자체가 뛰어난 것인지는 차치하고, 언어의 한계와 그 결과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음직스럽다. 울프가 어떤 생각을 하며 이 대목을 썼을지를 계속 상상하게 된다.
1-1. 울프는 영어가 신체적 증상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통찰했지만, 사실 이런 표현의 스펙트럼이 다른 언어라고 해서 크게 넓어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다(그리스 희곡을 영역할 때 열 몇 음절짜리 고통 표현을 ‘Ah!!’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다..이런걸 보면 영어가 좀 경직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어에는 ‘아프다’는 말, 혹은 ‘아’ 와 같은 음절(심지어 ‘아’는 ‘아픔’에 국한되는 표현도 아니다)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나, 를 고민해보게 된다. 보통 ‘아프다’ 앞에 부사어를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사어들도 대체로 청자의 경험에 고통을 빗대거나 고통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들이다. 고통에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찢어지게 아프다’ – 살이 찢어지는 또다른 경험에 고통을 빗댄다.
‘-할 정도로 아프다’
‘울렁거리다’ – 액체 표면의 움직임에 신체적 증상을 빗댄다.
‘지끈거리다’ – 깨지고 부러지는 소리도 ‘지끈거리다’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다.
(생각나는 대로 추가해볼 것)
1-2. 아픔이 언어로 분절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제기하고픈 의문이 있다면, 과연 아픔만이 그러한가?인 것 같다. 유효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아픔이 언어로 분절되지 못해 어떤 결과가 생겨난다면(그게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아픔의 분절 불가능성은 분명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언어의 사용이 용이하지 못한 건 신체적 증상의 표현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 같다. 감정이나 감각이 소재라면 다 그런 것 같기도..
2. <항해>의 25장은 레이첼이 열대병에 걸려 죽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쪽에서는 열감과 두통 그 자체를 두고 언어적 표현을 시도한다. 차가울까봐 몸이 어딘가에 닿지 않도록 하고, 방바닥은 굽고 흔들린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머리가 울리고, 뇌에는 맥박이 느껴지며, 뜨겁고 붉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울프의 입장을 고려하면, 울프는 이런 표현이 아픔을 그 자체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혹은 자신의 표현은 다르다고 생각했을까? 읽는 입장에서는 그 전후 다른 작가들의 소설들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 대목에서 고통에 대한 느낌은 우회로를 거쳐 청자에게 가닿는 것처럼 보인다. 이 표현들은 독자의 경험에 전달을 의존한다. 독자가 이 대목을 읽고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받았다면, 그것은 독자가 자신의 경험 – 방바닥이 굽고 흔들렸던, 맥박이 느껴졌던 – 그 순간에 자신의 신체에 존재했던 고통을 상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3. 한편, 25장의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고통 자체보다는 레이첼과 주변인들 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레이첼이 두통이 있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테렌스는 레이첼의 고통 자체와는 괴리된 생각을 한다. 레이첼은 어떤 상태에 있나? 레이첼은 죽을까? 그는 고통 자체를 이해하기 보다는 그 자신만의 두려움, 혐오, 절망, 초조에 빠지며, 이런 감정들은 테렌스를 레이첼과 다른 세계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레이첼이 누운 방 밖에서 모든 이들의 일상은 계속된다. 레이첼은 자신과 ‘일상 세계 사이에 그녀가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 부분이 강조된다는 게 다른 소설과의 차별점인 듯 하다. 이걸 타자에 대한 공감과 섞임에 대한 윤리적 문제로 해석해 당위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레이첼의 주변인들은 레이첼의 세계에 감응하지 않는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들 일반은 어떻게 타자의 세계에 섞여가며 살아야 하는지. 이런 해석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울프가 의도한 바와는 멀어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울프의 이러한 표현은 내(타인의) 아픔을 이해해 달라는 요구보다는, 오히려 이 간극을 완전히 좁힐 방법은 없다는 포고에 가까워 보인다. 언뜻 무책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적이고 회의적이며 또 생산적이다.
4. 25장을 읽고 저녁 내내 <하류>가 떠올랐다. 차이밍량이 언어에 대해 보이는 완연한 불신이 너무 좋다. 이런 불신은 간명하고 효과적이다. 아픈 강생은 너무나 우습게 그려지고, 걱정하는 아버지와 강생의 대화는 내용이 없다 – 완탕 맛있니? / 배 안고프단 말이에요! 아픈 이를 설명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뻔뻔함이 좋다.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는 선언이, 또 아무도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이, (그래서) 목을 잡고 헤매는 인물을 맥없이 담는 무위가 차라리 최선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나마 윤리적이지 않냐고 하면 지나치게 회의적인 걸까? 혹은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걸까? 그리고 언어를 불신하는 차이밍량은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하는건지?(쓰고 싶은 답 이미 있음) 차이밍량이 얼마나 언어를 불신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글을 써보고 싶다. 하류 보고 자야지~
Leave a comment